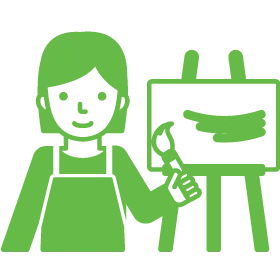‘귀농’ 이름만으로도 낭만 가득한 일, 그 멋진 일이 내게도 어울리는지 알아보려고 악양에 와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다. 3월에 왔으니 석 달이 조금 지났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다. 3월에 악양에 왔을 때는 매화가 조금씩 피어 있었을 뿐, 다른 작물들이나 들풀들도 거의 없었다. 메말라 보이는 논과 밭, 들과 산이었다. 그 메말라 보이는 밭에 씨앗을 심고, 죽어 있는 것만 같은 감나무 가지치기를 했었다.
그런데 6월 초인 지금은 베어내도 금세 또 그만큼 자라 있는 들풀들과 손바닥보다도 더 커진 감나무 잎사귀들, 호두알만큼 커진 매실들을 보면서 생명을 가꾸는 농부야말로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위대한 일을 하는 만큼 몸이 고되다. 3월에는 온 몸에 파스를 바르고 붙이며 살았다. 앉을 때 아이고, 일어설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다. 어디서든 머리를 대면 바로 잠들 수 있었고, 어서 해가 떨어져 저녁 먹고 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악양에 와서 지낼 수 있게 된 건, 먼저 귀농한 선배이자 농사 사부님 덕분이다. 사부님과 거의 모든 일들을 같이 하는데, 그는 일을 시작하기 앞서 꼭 먼저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몸으로 하는 법을 보여준다. 하지만 잘 듣고 본 대로 따라하려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왜 가르쳐주신 대로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허허. 가르쳐주는 대로 금세 되면 다 농사짓지.” 한다. 그래 욕심이다.
밭에서 마늘을 수확하고 있는 최명희 씨
사부님과 일을 하다 보면 삶의 진리(?) 같은 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다. 며칠 전에는 마늘을 뽑았다. 다른 집들보다 조금 늦게 뽑기도 했고, 올해는 너무 가물어서 마늘대가 말라 부서져 뽑히지 않거나 누워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이라 이번에는 실력을 뽐낼 수 있을 거 같다.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하라는 사부님 이야기를 뒤로 하고 무릎을 꿇고 빠르게 뽑는다. 마늘대가 말라비틀어진 놈들은 흙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캐낸다.
처음에 시범을 보여주시고서 감나무에 농약을 뿌리고 오신 사부님은 방석에 앉아 마늘을 뽑는다. ‘저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일하면 속도가 안 나는데...’하며 내멋대로 열심히 마늘을 뽑는다. 뜨겁던 해가 형제봉 쪽으로 기울면서 더위도 조금씩 사그라든다. 아직 뽑아야 할 마늘이 많지만, 어차피 오늘 다 못할 테니 내일 하자 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간다.
차를 타고 가면서 사부님이 “마늘은 양파와 달라. 양파는 알이 굵어 있는지 없는지 겉에서 봐도 뚜렷하게 알 수 있지만 마늘은 마늘대가 보이지 않거나, 말라비틀어져 있거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손을 넣어보면 있는 것들이 많아. 크고 보기 좋은 것들은 누구나 거두기 쉬워. 작고 볼품 없는 것들, 그런 걸 ‘삐품’이라고 하는데 대농들은 그런 걸 버리지. 그런데 소농들은 그런 걸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야. 그게 농사의 기술이지.”
오늘 또 한 대 맞았다. 크고 멋지고 뛰어난 것들도 귀하지만 작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것들도 똑같이 귀하다. ‘삐품’들도 온 힘을 다해서 살았을 테고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녀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내 탓이 큰데, 마지막까지 눈길을 덜 주었으니... 초등학생들과 지내면서 작고, 여리고, 표현하는 것이 서툰 어린이들에게 더 눈길을 쏟는다고 했던 거 같은데 여전히 모자라고 또 모자란다. 사부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은 스물네 살이 된 청년이 열두 살에 썼던 시가 떠올랐다.
감자
왕인지
감자는
알이 굵고 예쁘면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고
안 예쁘면
못났다 못났다 한다.
예쁘다 소리 들은 감자는
기쁘고 좋겠지만
못났다 소리 들은 감자는
슬퍼서 땅속에 들어가 썩고 만다.
최명희
경기도 과천에 있는 맑은샘학교(초등 대안학교)에서 10년 남짓 어린이들과 같이 공부하면 살고 있다. 오래전부터 농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