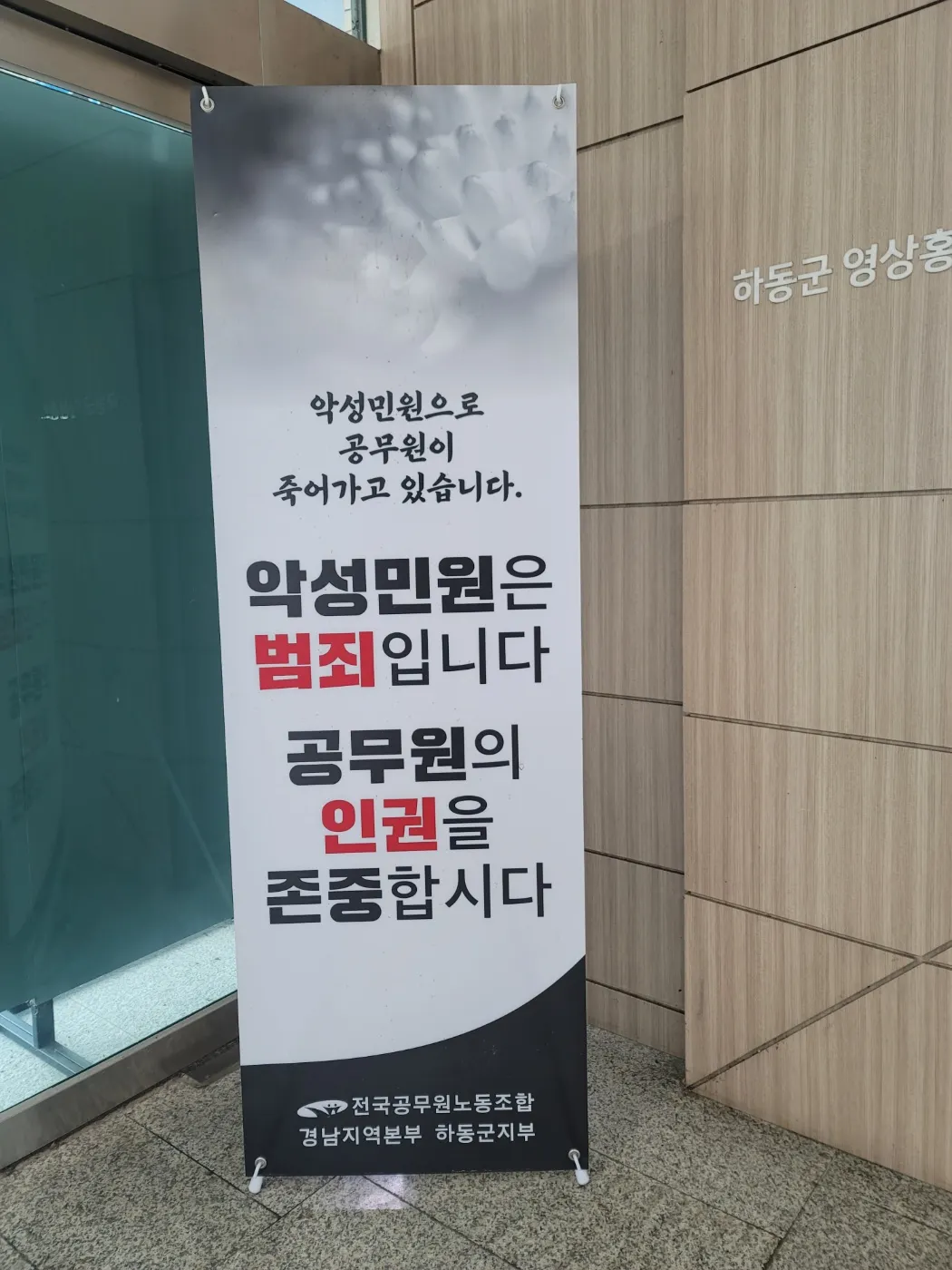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오하동> 신문 7월호, “농가 숨통 틔워주는 외국인 노동자”란 기사가 눈길을 끈다. 나 역시 약 20년 전, 한국노동연구원(KLI)에서 이 주제를 연구한 바 있다. 당시 산업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이기에 서둘러 독일식 고용허가제 내지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 현실은 개선되기도, 개악되기도 했다. 산업연수생제가 공식 철폐된 것은 개선이지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거나 기존 사업주 동의 없이는 이동이 힘들게 된 점 등은 개악이다. 앞의 기사는 하동군에 공식상 거주하는 1천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단순한 “인력”이 아닌 삶의 “동반자” 내지 “이웃”으로 보자고 제언한다. 지극히 옳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날로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을 보탠다.
하동에도 이주노동자 센터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