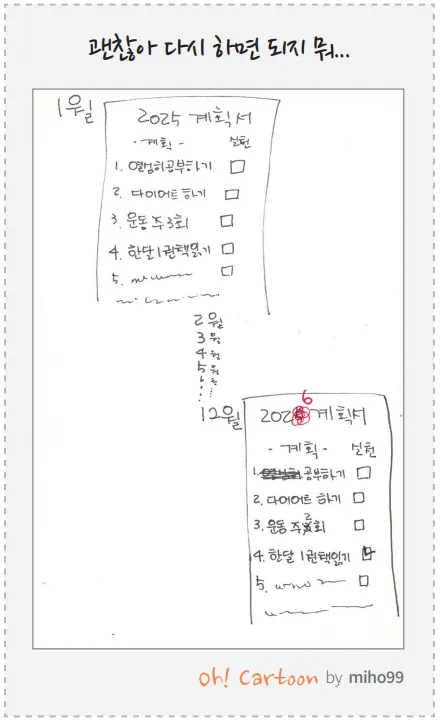흔히 정치 또는 이념의 지형을 좌와 우로 나눈다. 우는 보수, 즉 기존의 가치들(국가, 민족, 국토, 기득권 등)을 지키려는 입장이다. 좌는 기존의 틀을 넘어 보다 열린 세상으로 나가려는 진보 성향이다. 원론적으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처럼 보수와 진보는 조화를 이뤄야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론은 원론일 뿐, 현실은 참 다르다. 여기선 두 가지 측면만 보자. 하나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내용조차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점! 예컨대, 봉건적 가치를 고수하는 게 보수라면, 그걸 허물고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게 진보였다. 그러나 그 발전이 자본주의(상품, 경쟁, 이윤)로 치달으면서 그걸 고수하는 쪽이 보수, 자본주의를 지양하려는 쪽이 진보로 규정된다. 또, 원래 국토를 잘 보존해 후손에 물려주자는 건 보수의 가치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경제활동을 자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진보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는 역사 속에서 변한다.
다른 하나는 ‘좌우’라는 축을 중심으로 그 양 극단 또는 그 중간인 회색지대에서 여러 분파들이 생기는 점! 이른바 극우나 극좌, 중도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여기선 극우만 본다. 길게 보면 히틀러 시절의 독일 상황, 최근엔 트럼프 치하의 ‘마가(MAGA)’ 운동, 그리고 1년 전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등이 곧 극우주의다.
이들은 이 넓은 세상을 단순히 선악으로 나누고 자기들만 선, 나머지는 악으로 판단한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척결(뼈와 살을 발라냄) 대상화한다. 평소엔 차별과 혐오의 대상, 나중에는 배제와 죽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쿠데타 전에 윤석열이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 한 게 그 증거다. 극우주의의 심리적 기초는 증오심이다.
이런 풍조 아래서는 그에 대한 적극적 저항 세력만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일반인조차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국가보안법’ 아래 날조된 조직 사건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나아가 그 가족이나 후손들은 물론 사회 전반이 ‘빨갱이 콤플렉스’에 시달린다. 즉,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면서 양심의 소리나 진실조차 공개 발언 못하게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이 공고히 생긴다. 크게 보면 사회정치적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마음의 상처) 효과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과연 민주주의 선거라고 해서 정말 민주적 선택을 할까? ‘줄 한 번 잘못 서면 먹고살기 힘들어진다,’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내 양심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물론, 그 밖에도 한국은 혈연, 지연, 학연 따위에 의한 ‘묻지 마, 투표’ 성향이 몹시 강하다. 크게 보면 이 또한 ‘줄 잘 서기’라는 무언의 명령이자 트라우마 효과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다. 파커 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다. 이 책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의 위기 이전에 마음의 위기란 것! 즉, 정치적 분열과 혐오, 적대감을 넘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느냐가 핵심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 대다수다. 만일 이들을 방치하면 이들은 그저 ‘달콤한’ 속임수로 표를 얻으려는 자들, 세상을 선악으로 단순화하고 (자기편이 아닌) ‘모든 악’을 척결하자는 자들을 지지하기 쉽다.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파머에 따르면 이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을 ‘깨져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깨져서 열리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결정적이다. ‘창조적으로 긴장 끌어안기’란 방법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생명의 방향으로 끌어안을 때 갈등조차 민주주의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원리!
과연 2025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그리하여 두려움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저 ‘줄 잘 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민주 광장으로 나서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이 동네마다 활성화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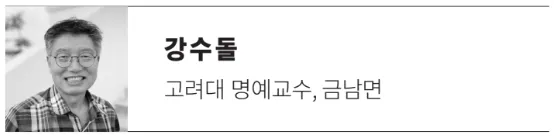



.jpg&blockId=2bd562b3-f944-80cc-9670-fe68a8d63a2c)

.jpg&blockId=2bd562b3-f944-80a3-912e-cc3c98e7aca1)